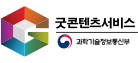공통
함양의 전설
몸이 두동강난 호랑이 [동자를 잡아먹은 호랑이]
함양에서 운봉으로 넘어가는 소백산 줄기의 팔령치 남쪽으로 솟아있는 산을 삼봉산이라 한다.
이 삼봉산 골짜기에 가면 그 흔적은 없지만 골짜기 이름이 절터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옛날에 이 곳에는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많은 노스님이 동자승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동자는 늙은 스님을 도와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숲속에서 땔나무를 해 오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며 때를 맞추어 종을 치기도 하면서 노승을 도왔다.
그런데 노스님은 가끔 시주를 걷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돌아오곤 하였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스님이 마을로 내려갔다가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어둠이 깔릴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였다.
어린 동자승은 날이 점점 저물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너무 늦게까지 스님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고 이심전심으로 사찰로 돌아오고 있는 노스님도 밤이 깊은 산속 절간에 혼자 남아있는 동자가 걱정이 되었다.
노스님은 동자를 염려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달리다시피 계곡길을 오르고 있는데 눈 앞에 큰 바위 위에서 빨간 두 개의 불더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심히 쳐다보니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스님과 호랑이와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고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땅에 지팡이를 세게 내려치면서 외쳤다.
“네 이놈 아무리 산짐승의 왕이라기로서니 네놈이 감히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
하고 호통을 치자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차린 듯 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옛날에는 산짐승이 많아서 산속에는 밤길을 가면 호랑이나 늑대를 만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고을마다 호랑이 만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어서 고을마다 호랑이 이야기나 늑대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돌에 채이고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동자가 염려되어 단숨에 달려 절로 돌아오게 되었다.
방문을 열자 동자승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스럽게 자고 있었다.
그런데 밤은 점점 깊어가고 노승은 일을 마치고 잠자리데 들 때가 되어 자리를 보고 있을 때쯤이었다. 문밖에서 애원하는 듯한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이상히 여긴 노승은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호랑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앉아 있지 않은가! 그 호랑이는 무엇인가 호소하는 듯한 태도로 끙끙거리며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놈, 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주위에서 서성대고 있느냐? 빨리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노승은 호랑이를 향해 호통을 치며 꾸짖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린 채 울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스님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네가 이러는 것을 보니 필시 무슨 사연이 있나보구나. 정히 이곳을 떠나기가 싫다면 저기 뒷곁에서 자고 내일 떠나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다.
동물은 말은 못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이틑날 아침, 스님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랑이가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린 채로 있었던 것이었다. 하는 짓을 보니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영물이라 생각되었다.
노승은 어젯밤부터의 호랑이가 행한 행동을 보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고는 해를 입힐 것 같지 않아 절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호랑이는 어린 동자승과 점점 친하게 되었고 강아지처럼 아양을 떨며 따르게 되었다.
노스님 역시 호랑이가 어린 동자와 사귀어 같이 놀고 재롱을 부리고 하는 것이 무척 귀여웠다.
또 산속에서 동자를 지켜주는 좋은 벗이라 생각해서 더 마음 든든하고 안심하며 시주를 떠날 수가 있었다.
산속에 혼자 두고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은 늘 마음을 조이게 하고 걱정이 되게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이 절에 머물고 나서부터는 사찰 주변에 늑대나 오소리같은 야수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노승은 동자승과 호랑이를 남겨두고 일찍이 함양으로 시주를 떠나면서 동자승에게
“내가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저녁밥을 지어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하며 절을 떠나 아래로 내려갔다.
노승은 시주하러 떠나가고 동자와 호랑이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았다.
저녁때가 되어 공양시간이 가까워오자 호랑이는 산으로 달려가 나무를 구해오고 동자승은 공양식을 짓기 위해 나무를 잘랐다.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하여 그만 손가락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손가락에서는 빨간 선지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때 산으로 땔감을 물고 들어오던 호랑이가 이것을 보게 되었다.
“호랑아, 손가락에 피가 많이 흐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동자승은 말하였다.
호랑이 역시 동자승이 걱정되었는지 자기의 혀로 피를 햝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맛보지 못하고 참아왔던 피맛에 그만 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동자승에게 달려들어 동자승을 잡아먹고 말았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다.
이 호랑이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호랑이는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난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때였다. 산신령님이 나타나 호랑이를 꾸짖었다.
“네 이놈, 네놈이 살생을 많이 하여 진작 죽일려고 했으나 네놈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아니하고 산다기에 반드시 사람과 어울려 살라하였더니 또 이런 짓을 하다니,”
하고 분노하며 외쳤다.
산신령이 호령을 하며 지팡이로 호랑이의 등을 내려치니 호랑이의 몸은 두동강이가 되어서 뒷부분은 맞은 편에 서 있는 뇌산마을 뒷산으로 날아가 박혀버렸고 앞부분은 멀리 지리산쪽으로 날아가 어딘가에 박혀 버렸다.
늦게 절로 돌아온 노승은 절가에 인적은 없고 동자승의 피묻은 옷만 어지러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서는 동자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절에 오래 머물를수가 없어 하산해 버리고 말았다.
그 때부터 절은 주인 없는 빈 곳이 되어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되고 지금은 예전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터골이라는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목록이 삼봉산 골짜기에 가면 그 흔적은 없지만 골짜기 이름이 절터골이라고 불리는 곳이 있다.
옛날에 이 곳에는 조그마한 사찰이 하나 있었는데 나이 많은 노스님이 동자승을 하나 데리고 살고 있었다.
동자는 늙은 스님을 도와서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숲속에서 땔나무를 해 오기도 하고 밥을 짓기도 하며 때를 맞추어 종을 치기도 하면서 노승을 도왔다.
그런데 노스님은 가끔 시주를 걷기 위해 마을로 내려갔다 돌아오곤 하였다.
이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노스님이 마을로 내려갔다가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녀서 어둠이 깔릴 때까지 돌아오지 못하였다.
어린 동자승은 날이 점점 저물어지고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너무 늦게까지 스님이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었고 이심전심으로 사찰로 돌아오고 있는 노스님도 밤이 깊은 산속 절간에 혼자 남아있는 동자가 걱정이 되었다.
노스님은 동자를 염려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달리다시피 계곡길을 오르고 있는데 눈 앞에 큰 바위 위에서 빨간 두 개의 불더이가 번쩍이고 있었다.
스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유심히 쳐다보니 호랑이가 눈에 불을 켜 버티고 앉아 있는 것이었다.
스님과 호랑이와의 시선이 마주치게 되었고 스님은 눈을 부릅뜨고 땅에 지팡이를 세게 내려치면서 외쳤다.
“네 이놈 아무리 산짐승의 왕이라기로서니 네놈이 감히 사람을 놀라게 하다니”
하고 호통을 치자 호랑이는 그 말을 알아차린 듯 번개같이 사라지고 말았다.
옛날에는 산짐승이 많아서 산속에는 밤길을 가면 호랑이나 늑대를 만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고을마다 호랑이 만나는 일이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어서 고을마다 호랑이 이야기나 늑대 이야기는 지금도 많이 남아 있는것을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스님은 발걸음을 재촉하여 돌에 채이고 나무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동자가 염려되어 단숨에 달려 절로 돌아오게 되었다.
방문을 열자 동자승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평화스럽게 자고 있었다.
그런데 밤은 점점 깊어가고 노승은 일을 마치고 잠자리데 들 때가 되어 자리를 보고 있을 때쯤이었다. 문밖에서 애원하는 듯한 호랑이의 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이상히 여긴 노승은 문을 열어 밖을 내다보니 호랑이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며 앉아 있지 않은가! 그 호랑이는 무엇인가 호소하는 듯한 태도로 끙끙거리며 몸을 숙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놈, 왜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주위에서 서성대고 있느냐? 빨리 물러가지 못할까.”
하고 노승은 호랑이를 향해 호통을 치며 꾸짖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계속해서 머리를 조아린 채 울고 있었다.
이를 이상히 여긴 스님은 필시 무슨 사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네가 이러는 것을 보니 필시 무슨 사연이 있나보구나. 정히 이곳을 떠나기가 싫다면 저기 뒷곁에서 자고 내일 떠나도록 하여라.”
하고 말하자 신기하게도 호랑이는 스님의 말을 따르는 것이었다.
동물은 말은 못하지만 말귀를 알아듣는 것 같았다.
이틑날 아침, 스님은 또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호랑이가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머리를 조아린 채로 있었던 것이었다. 하는 짓을 보니 아무래도 범상치 않은 영물이라 생각되었다.
노승은 어젯밤부터의 호랑이가 행한 행동을 보면 범상치 않다고 생각하고는 해를 입힐 것 같지 않아 절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였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호랑이는 어린 동자승과 점점 친하게 되었고 강아지처럼 아양을 떨며 따르게 되었다.
노스님 역시 호랑이가 어린 동자와 사귀어 같이 놀고 재롱을 부리고 하는 것이 무척 귀여웠다.
또 산속에서 동자를 지켜주는 좋은 벗이라 생각해서 더 마음 든든하고 안심하며 시주를 떠날 수가 있었다.
산속에 혼자 두고 마을로 내려간다는 것은 늘 마음을 조이게 하고 걱정이 되게 하는 문제였던 것이다.
그리고 호랑이가 이 절에 머물고 나서부터는 사찰 주변에 늑대나 오소리같은 야수들이 나타나지 않게 되었다.
여느때와 마찬가지로 이날도 노승은 동자승과 호랑이를 남겨두고 일찍이 함양으로 시주를 떠나면서 동자승에게
“내가 좀 늦게 도착하더라도 저녁밥을 지어 부처님전에 공양 올리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말하며 절을 떠나 아래로 내려갔다.
노승은 시주하러 떠나가고 동자와 호랑이는 서로 장난을 치면서 놀았다.
저녁때가 되어 공양시간이 가까워오자 호랑이는 산으로 달려가 나무를 구해오고 동자승은 공양식을 짓기 위해 나무를 잘랐다.
나무를 자르다가 잘못하여 그만 손가락을 베어버리고 말았다.
손가락에서는 빨간 선지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이 때 산으로 땔감을 물고 들어오던 호랑이가 이것을 보게 되었다.
“호랑아, 손가락에 피가 많이 흐르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동자승은 말하였다.
호랑이 역시 동자승이 걱정되었는지 자기의 혀로 피를 햝는 것이었다.
그 순간 오랫동안 맛보지 못하고 참아왔던 피맛에 그만 정신을 잃고 미친 듯이 동자승에게 달려들어 동자승을 잡아먹고 말았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 드러나고 마는 것이다.
이 호랑이도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자 호랑이는 자기가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난 때는 이미 늦었다.
이 때였다. 산신령님이 나타나 호랑이를 꾸짖었다.
“네 이놈, 네놈이 살생을 많이 하여 진작 죽일려고 했으나 네놈이 다시는 그런 짓을 아니하고 산다기에 반드시 사람과 어울려 살라하였더니 또 이런 짓을 하다니,”
하고 분노하며 외쳤다.
산신령이 호령을 하며 지팡이로 호랑이의 등을 내려치니 호랑이의 몸은 두동강이가 되어서 뒷부분은 맞은 편에 서 있는 뇌산마을 뒷산으로 날아가 박혀버렸고 앞부분은 멀리 지리산쪽으로 날아가 어딘가에 박혀 버렸다.
늦게 절로 돌아온 노승은 절가에 인적은 없고 동자승의 피묻은 옷만 어지러이 널려있는 것을 보고서는 동자의 죽음을 알게 되었고 그 절에 오래 머물를수가 없어 하산해 버리고 말았다.
그 때부터 절은 주인 없는 빈 곳이 되어 세월이 흘러 폐허가 되고 지금은 예전에 절이 있었다하여 절터골이라는 이름만 전해지고 있다.
으로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3.08.17 13:1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