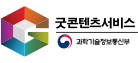백전면
함양의 전설
소금장수가 빠져죽은 소(沼) [바람둥이 소금장수]
백전면에는 백운산(1278m)이 있는데 산이 높고 아름다워 함양에서 일일 등산코스로 적합한 곳이다.
이 산은 함양을 기름지게 적셔주는 위천수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산 밑에는 백운리와 운산리 두개의 마을이 있다.
마을 이름도 백운산 밑에 있다하여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그 중 운산에서 중기마을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소(沼)가 하나 있는데 이 소는 '소금쟁이소'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였다.
옛날에 고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소금장수가 이 마을에 소금을 팔러 종종 오곤 하였다.
몸집이 크고 장골인 이 소금장수는 일년에 두어번씩 소금을 팔러와 한 사나흘씩 묵고는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이 소금장수는 마을의 아녀자들에게는 귀한 손님처럼 기다려지는 사내였다.
그것은 함양장에서보다 싼 값으로 소금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시꺼멓게 피부가 탄 모습으로 농사나 짓고 멋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편에 비해 소금장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사방을 떠돌면서 겪은 경험담이나 많은 문물을 접한 일들을 걸직한 입담으로 이야기 해 줄때면 아녀자들은 울고 웃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래서 말 잘하고 웃기길 잘하기 때문에 단연 소금장수가 인기를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금장수가 이 마을에 오게 되면 먹이를 던져주면 몰려드는 물고기떼처럼 아녀자들이 몰려들어 소금장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어떤 아낙들은 애교스런 눈짓을 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소금장수를 기다리는 이 들은 과부들과 주막의 주모였다.
혼자 사는 설움과 성정의 회포를 풀 수가 없었던 그녀들에게는 그 소금장수가 낭군이나 되는 듯이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소금장수가 이 마을에서 머물다가 떠난 후에 주막집 주모는 꿩먹고 알먹고 누구누구 과부는 톡톡히 소원풀기를 했다는 둥 소문이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가롭고 무료한 산골마을에서 한 동안 재미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가 다시 소금을 팔러 왔다. 소금장수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 아낙네들은 함박이나 소쿠리를 들고 엉덩이를 흔들며 몰려들었다.
“이봐요, 소금장수 그동안 어디에서 소금을 팔다 왔수?”
“진양, 창녕, 합천에서 팔다 왔수다.”
“우리 마을에 며칠간이나 머물다 갈 거요?”
“글쎄요, 모레나 갈 참이요.”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털어놓고 푹 쉬었다 가이소.”
“허허, 까짓껏 그래보죠. 고향이 없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나 반겨 줄 여편네도 없으니 말이오. 역마살이 끼어 조선 천지를 떠도는 이 몸 그래도 고향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마을이 좋단 말입니다.”
“안아주기는 누가 안아줘요? 호호호.”
아낙네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아낙네들 틈에 끼어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과부가 저번에 소금장수가 왔을 때 연정을 못이겨 서로 정을 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이도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생기고 말았다.
이미 육개월이 되어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와 근심 속에서 소금장수를 기다려 왔던 터였다.
과부는 그동안 행여 누가 이 사실을 알까봐 괴로워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화냥년이라 배척을 받을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불안하게 생각한 것은 그녀 혼자 애비없는 아기를 키울 수는 없다는 것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소금장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고 그를 따라 나서리라 다짐 해오던 터였다.
그날 저녁 과부는 소금장수가 묵고 있는 주막엘 찾아갔다.
그런데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주모와 소금장수가 재미를 보고 있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과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질투심이 일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렸다가 끝마친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잔기침을 하며 기척을 알리자 주모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다.
미처 저고리 끈을 묶지도 않아 달빛에 풍만한 앞가슴이 내비쳤다.
“웬일이요? 이밤에...”
주모는 재미를 보고 있을 때 나타난 훼방꾼에게 쌀쌀맞게 물었다.
과부는 주저 하다가 말을 꺼냈다.
“소금장수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고 말끝을 흐렸으나 자기 사내를 주모에게 빼앗긴 것처럼 생각되어 참담하게 느껴졌다.
“할 말이 있으면 내일 해도 될 것을 밤에 찾아와서...호색에 눈이 멀면 밤낮을 모른다더니.”
하고 주모는 질투심으로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기분같아서는 주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으나 그런 감정을 내비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소금장수가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오?”
“저 긴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오.”
“여기서는 안돼요. 호젓한 곳에서 얘기를 좀 해요.”
과부와 소금장수는 희미한 달빛을 타고 저번에 한몸으로 어우러졌던 디딜 방앗간으로 갔다.
“저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소? 머뭇거리지 말고 얘기 하시오.”
“저 임자의 씨앗을 뱃속에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임자와 재미를 본 씨예요.”
“뭐라고? 내 씨라구. 안돼요.”
“뱃속에... 넉달만 있으면 아기를 낳게 돼요. 어쩔줄 몰르겠어요.”
“어쩌긴 어째요. 장녹뿌리를 달여 먹어서 뱃속의 아기를 없애버려요. 난 아비노릇도 제대로 못할 위인이요.”
소금장수는 자신의 씨앗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거예요. 우리 두사람이 합쳐서 함께 살아요. 아기를 낳고 말이예요.”
“그럴 순 없소. 난 내 입막음도 못하는 사람이요. 또 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조선천지를 떠도는 역마살이 낀 팔자를 타고 났어요. 그래서 합칠 수가 없소.”
“그래도 가정을 꾸미고 아기를 낳고 살면 역마살도 없어질 거예요. 예, 제발 함께 살아요.”
“아무튼 집에 가 기다려요. 내일 저녁 집으로 찾아갈 거요. 그때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소금장수는 과부를 집으로 돌려 보내고 다시 주막집으로 되돌아가 술을 마셨다.
그는 크게 술에 취하여 모든 짐을 놔두고 몰래 이 마을을 도망치려고 하였다.
주모가 취하여 잠들자 그는 비틀거리며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너무 술에 취해 좌우를 못가리고 아무렇게나 걸으며 도망치다가 마을 남쪽에 있는 소에 이르러 빠져죽고 말았다.
정말 하늘의 벌을 받고 빠져 죽었는지 뜬 눈으로 죽어 있었다.
한편 과부는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죽어 소금장수의 죄악을 더욱 들어내고 말았다고 한다.
목록이 산은 함양을 기름지게 적셔주는 위천수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산 밑에는 백운리와 운산리 두개의 마을이 있다.
마을 이름도 백운산 밑에 있다하여 그렇게 지어진 것이다.
그 중 운산에서 중기마을쪽으로 조금 가다보면 소(沼)가 하나 있는데 이 소는 '소금쟁이소'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렇게 불리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였다.
옛날에 고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는 소금장수가 이 마을에 소금을 팔러 종종 오곤 하였다.
몸집이 크고 장골인 이 소금장수는 일년에 두어번씩 소금을 팔러와 한 사나흘씩 묵고는 또 어디론가 훌쩍 떠나버리는 것이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사람이었다.
이 소금장수는 마을의 아녀자들에게는 귀한 손님처럼 기다려지는 사내였다.
그것은 함양장에서보다 싼 값으로 소금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며 뿐만 아니라 시꺼멓게 피부가 탄 모습으로 농사나 짓고 멋대가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남편에 비해 소금장수는 재미있는 사람이었다.
사방을 떠돌면서 겪은 경험담이나 많은 문물을 접한 일들을 걸직한 입담으로 이야기 해 줄때면 아녀자들은 울고 웃고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래서 말 잘하고 웃기길 잘하기 때문에 단연 소금장수가 인기를 독차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소금장수가 이 마을에 오게 되면 먹이를 던져주면 몰려드는 물고기떼처럼 아녀자들이 몰려들어 소금장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어떤 아낙들은 애교스런 눈짓을 하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유별나게 소금장수를 기다리는 이 들은 과부들과 주막의 주모였다.
혼자 사는 설움과 성정의 회포를 풀 수가 없었던 그녀들에게는 그 소금장수가 낭군이나 되는 듯이 기뻐하며 맞이하였다.
소금장수가 이 마을에서 머물다가 떠난 후에 주막집 주모는 꿩먹고 알먹고 누구누구 과부는 톡톡히 소원풀기를 했다는 둥 소문이 우물가나 빨래터에서 이야기꽃을 피웠다.
한가롭고 무료한 산골마을에서 한 동안 재미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소금장수가 다시 소금을 팔러 왔다. 소금장수가 왔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마을 아낙네들은 함박이나 소쿠리를 들고 엉덩이를 흔들며 몰려들었다.
“이봐요, 소금장수 그동안 어디에서 소금을 팔다 왔수?”
“진양, 창녕, 합천에서 팔다 왔수다.”
“우리 마을에 며칠간이나 머물다 갈 거요?”
“글쎄요, 모레나 갈 참이요.”
“재미있는 이야기 좀 많이 털어놓고 푹 쉬었다 가이소.”
“허허, 까짓껏 그래보죠. 고향이 없고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나 반겨 줄 여편네도 없으니 말이오. 역마살이 끼어 조선 천지를 떠도는 이 몸 그래도 고향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이 마을이 좋단 말입니다.”
“안아주기는 누가 안아줘요? 호호호.”
아낙네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아낙네들 틈에 끼어 수심에 찬 얼굴을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었다.
젊은 나이에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과부가 저번에 소금장수가 왔을 때 연정을 못이겨 서로 정을 통하게 되었다.
그런데 불행이도 자신의 뱃속에 생명이 생기고 말았다.
이미 육개월이 되어 눈에 띄게 배가 불러와 근심 속에서 소금장수를 기다려 왔던 터였다.
과부는 그동안 행여 누가 이 사실을 알까봐 괴로워했다.
마을 사람들에게 화냥년이라 배척을 받을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그녀가 불안하게 생각한 것은 그녀 혼자 애비없는 아기를 키울 수는 없다는 것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소금장수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하고 그를 따라 나서리라 다짐 해오던 터였다.
그날 저녁 과부는 소금장수가 묵고 있는 주막엘 찾아갔다.
그런데 희미한 호롱불 아래서 주모와 소금장수가 재미를 보고 있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다. 과부는 피가 거꾸로 솟는 질투심이 일었다.
그러나 참고 기다렸다가 끝마친 때가 되어서야 그녀는 잔기침을 하며 기척을 알리자 주모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 보았다.
미처 저고리 끈을 묶지도 않아 달빛에 풍만한 앞가슴이 내비쳤다.
“웬일이요? 이밤에...”
주모는 재미를 보고 있을 때 나타난 훼방꾼에게 쌀쌀맞게 물었다.
과부는 주저 하다가 말을 꺼냈다.
“소금장수와 할 이야기가 있어서...”
하고 말끝을 흐렸으나 자기 사내를 주모에게 빼앗긴 것처럼 생각되어 참담하게 느껴졌다.
“할 말이 있으면 내일 해도 될 것을 밤에 찾아와서...호색에 눈이 멀면 밤낮을 모른다더니.”
하고 주모는 질투심으로 말끝을 흐리며 중얼거렸다.
기분같아서는 주모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었으나 그런 감정을 내비칠 수는 없었다.
이윽고 소금장수가 밖으로 나왔다.
“무슨 일이오?”
“저 긴한 얘기가 있어서...”
“무슨 얘기오.”
“여기서는 안돼요. 호젓한 곳에서 얘기를 좀 해요.”
과부와 소금장수는 희미한 달빛을 타고 저번에 한몸으로 어우러졌던 디딜 방앗간으로 갔다.
“저어...”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무슨 할 말이 있소? 머뭇거리지 말고 얘기 하시오.”
“저 임자의 씨앗을 뱃속에 갖고 있어요. 지난번에 여기서 임자와 재미를 본 씨예요.”
“뭐라고? 내 씨라구. 안돼요.”
“뱃속에... 넉달만 있으면 아기를 낳게 돼요. 어쩔줄 몰르겠어요.”
“어쩌긴 어째요. 장녹뿌리를 달여 먹어서 뱃속의 아기를 없애버려요. 난 아비노릇도 제대로 못할 위인이요.”
소금장수는 자신의 씨앗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하늘의 벌을 받을거예요. 우리 두사람이 합쳐서 함께 살아요. 아기를 낳고 말이예요.”
“그럴 순 없소. 난 내 입막음도 못하는 사람이요. 또 난 한 곳에 머물지 못하고 조선천지를 떠도는 역마살이 낀 팔자를 타고 났어요. 그래서 합칠 수가 없소.”
“그래도 가정을 꾸미고 아기를 낳고 살면 역마살도 없어질 거예요. 예, 제발 함께 살아요.”
“아무튼 집에 가 기다려요. 내일 저녁 집으로 찾아갈 거요. 그때 차근차근 얘기해 봅시다.”
소금장수는 과부를 집으로 돌려 보내고 다시 주막집으로 되돌아가 술을 마셨다.
그는 크게 술에 취하여 모든 짐을 놔두고 몰래 이 마을을 도망치려고 하였다.
주모가 취하여 잠들자 그는 비틀거리며 마을을 빠져나가기 시작하였다.
너무 술에 취해 좌우를 못가리고 아무렇게나 걸으며 도망치다가 마을 남쪽에 있는 소에 이르러 빠져죽고 말았다.
정말 하늘의 벌을 받고 빠져 죽었는지 뜬 눈으로 죽어 있었다.
한편 과부는 아기를 낳다가 아기와 함께 죽어 소금장수의 죄악을 더욱 들어내고 말았다고 한다.
으로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3.08.10 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