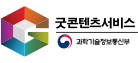마천면
함양의 전설
변강쇠전 [함양 마천을 지리적 배경으로 한 판소리]
중년 (中年)에 맹랑한 일이 있었다.
평안도 월경촌(月景村)에 계집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춘이월 반쯤 핀 복숭아꽃이었다.
보조개(옥빈)는 어리었고 초생에 지는 달빛이 눈썹 사이에 어리었다.
앵두처럼 고운 입술은 당채(唐彩)주홍필로 찍은 듯하고 버드나무같이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하늘 하늘, 찡그리며 웃는것과 말하며 걷는 것이 서시와 포사라도 따를 재간이 없었다.
그러나 사주에 청상살이가 겹겹이 쌓인 까닭에 상부(喪夫)를 한 것이 징글징글하게 많아 팔자가 센 여자였다.
열다섯에 얻은 서방은 첫날밤의 잠자리에서 급상한(急傷寒)에 죽었고
열여섯살에 얻은 서방은 당창병(매독)에 죽었다.
열일곱과 열여덟에 얻은 남편은 용천병과 벼락으로 각각 죽었다.
열아홉, 스무살에 얻은 서방도 급살로 죽었다.
뿐만 아니었다.
간부, 애부, 새흘유기, 입 한번 맞춘 놈, 젖 한번 만진놈, 눈 흘레한 놈, 손 만져본 놈, 그리고 심지어는 옹녀의 치마귀 상처자락 얼른 대한 놈까지 모두 죽었다.
이렇게 하여 수천명씩 남자들이 옹녀 때문에 죽자 삼십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내는 고사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도 다 쓸어버리고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집을 지으니 황해도, 평안도 양도민이 공론하기를 이년을 그냥 두었다간 남자 놈은 한명도 없는 여인국이 될 터니이니 쫒아내자고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양 도민이 합세하여 그녀를 서도에서 쫓아내었다.
그때 그녀는 차랑 봇짐 옆에 끼고 머리는 동백기름을 낭자하게 발라 곱게 빗었고 초록 옷을 추스르며 행똥행똥 나오면서 자기 혼자 악을 썼다.
“어허, 인심이 흉악하구나, 내 여기 아니면 살 곳이 없을 줄알고,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남자들은 더욱 좋다더라,”
옹녀는 남쪽으로 가다가 청석관(개성 부근의 좁은 계곡)에서 홀아비 변강쇠와 만났다.
변강쇠는 삼남에서 빌어 먹다가 양서지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 말 몇 마디에 뜻이 맞아 바위 위에 올라가서 대사(大事)를 치루었는데 대낮에 년놈이 벌거벗고 익숙한 장난을 하고 있었다.
타고난 양골(陽骨)인 강쇠놈이 옹녀의 두 다리를 번쩍 들고 옥문관을 들여다 보며 노래를 읊었다.
“이상하게도 생겼다. 맹랑히도 생겼다. 늙은 중의 입일는지 털은 돋고 이빨은 없구나. 소나기를 맞았는지 언덕지게 패이었다. 콩밭농사 지었는데 듬북꽃이 비치었구나. 도끼날을 맞았는지 금 바르게 터져 있네, 생수처 온답(溫畓)인지 물이 항상 고이었다.
무슨 말을 할려고 옴질옴질하는 건지 만경창파 조개인지 혀를 빼어 물었으며 곶감을 먹었는지 곶감씨가 장물렸고 만첩산중 으름인지 스스로 잘도 벌어졌네 연계탕을 먹었는지 닭의 벼슬이 비치었고 파명당을 하였는지 더운 김이 절로 난다.
제 무엇이 즐거운지 반쯤 웃고 있구나. 곶감 있고 연계 있고 조개 있어 제사상은 걱정없다'
옹녀가 반소(半笑)하고 갚음을 하느라고 변강쇠의 기물을 어루만지며 한가닥 곡조를 빼어 읊었다.
“이상히도 생겼구나. 맹랑히도 생겼구나. 전배사령(前培伺令) 서렸는지 쌍걸랑을 늦게 차고 군노(軍奴)런가 복떠기를 붉게 쓰고 냇물가의 물방인지 떨구덩 떨구덩 끄덕인다.
송아지 말뚝인지 철고삐를 둘렀구나. 감기를 얻었는지 맑은 코가 웬일인가, 성정(性情)도 혹독하여 화가 나면 눈물난다. 어린아이 병일는지 젖은 어찌 괴였으며 제사에 쓴 숭어인지 꼬장이궁이 그저 있다. 뒷절 큰방 노승인지 민대가리 둥글구나. 소년인사 알밤인지 두쪽 한데 붙어있다. 물방아 절구대며 쇠고삐걸랑 등물 세간살이 걱정없네.”
두 남녀는 서로 뜻이 맞아 부부로 인연을 맺고 각처를 떠돌며
옹녀는 애를 써써 들병장수 막장사를 할 때
변강쇠는 낫부림 넉장기, 갑사꼬리 여사하기, 미골 지패 퇴기질, 호흥호백 쌍육치기, 장군멍군 장기두기, 맞춰먹기 돈치기와 불러먹기 주먹질 고패떼기 윷놀이와 안집 뒷집 고누두기, 의복 전당 술먹기와 남의 싸움 가로막기, 강새암 계집치기, 밤낮으로 싸움질을 일삼았다.
이에 옹녀는 변강쇠를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성기 가지고는 동반살이 하다가는 돈 모으기는 고사하고 남의 손에 죽을 테니 깊은 산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전이나 파서 먹고 땔나무나 베어 때면 노름도 못할 터요, 강짜도 않을테니 산중으로 들어갑세.”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갈 산을 의논하였다.
“동금강(東金剛)은 석산이라 나무 한그루 없어 갈 수 없고 북향산(北香山)은 찬곳이라 눈 쌓이어 살 수 없고 서구월(西九月)은 좋다하나 산적떼 소굴이라 살 수 없으니 남지리(南智異)가 토후하여 생리가 좋다하니 그리로 찾아감세.”
여간가산(如干家山)짊어지고 지리산중에 찾아가니 깊은 산골에 빈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임진왜란 때 어느 부자가 지었는지 오간 팔작 기와집으로 다시 사람 산일이 없는 흉가였다.
누백년 도깨비의 동청이요. 묏귀신의 사당으로 있었다.
거친 뜰에는 삵과 여우의 발자취가 남아 있었다.
“수사도는 간 곳마다 선화당(宣化堂)이라 하더니 내 팔자도 비슷하구나. 적막한 이 산중에 내가 올 줄 누가 알고 나를 위해 이런 기와집을 지어놓고 기다렸는가.”
하고 변강쇠는 말했다.
변강쇠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낮이면 잠만 자고 밤이면 배만 타니 여인이 애끓게 하소연 하였다.
변강쇠는 하는 수 없이 아내의 청에 따라 지게를 지고 담뱃대를 물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
“목 긁어 동여지고 석양의 산길 내려올 때 손님보고 절은 하니 품안에 있는 산과(山果) 떼그르르 다 떨어진다. 얼레, 비 맞고 가는 한 손님 술집이 어디 있노. 저 건너 행화촌을 손을 들어 가리킨다. 얼레, 뿔 굽은 소를 타고 단적(短笛)을 불고 가니 유황숙이 보았더면 나를 오죽이나 부러워하리 얼레.”
강쇠가 나무하러 가다가 등구 마천 초군들을 만나 그들의 노래를 모두 들은 다음
제가 보아도 어린 것들과 한가지로 갈퀴나무를 할 수 있나,
도끼 둘러 메고 이봉 저봉 다니면서 그 중 커다란 나무만 한 두 번씩 찍은 후에 나무 내력 말을 하며 제가 저를 꾸짖었다.
“오동나무 벼자하니 요임금의 오현금(五絃琴)이요,
살구나무 벼자하니 공부자(孔夫子)의 강단이라,
소나무 좋다마는 진시황의 오태부(五太夫)요
잣나무 좋다마는 한고조 덮은 그늘이라.
어주축수 애산춘 홍도나무 사랑하옵고
위성조우 읍경진 버드나무 좋을시고
밤나무 신주감이요, 전나무는 돛대 재목이라,
가사목 단단하나 각영문(各營門) 곤장감이요,
참나무 꼿꼿하나 배젓는 대목감이라,
쭝나무 오시목과 산유자 용목, 건팽목 문목은 화목되기 아깝도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베일 나무 전혀 없다. 산중에 동천맥 우물물 좋은 곳에 점심구럭 풀어 먹은 후에 부쇠를 얼른 쳐서 담배를 입에 물고 솔그늘 잔디밭에 돌베고 누우면서 당음(唐音)한 귀 읊어보네.
“우래송수불(雨來松樹不)에 고침석두면(高枕石頭眠)이 나를 두고 한 말이라 잠자리 장히 좋다.”
강쇠가 잠을 자며 코를 골자 산중이 들썩들썩하였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땐 하늘에 별이 총총하였고 이슬이 내리었다 게을리 일어나서 기지개를 불끈켜 뒤꼭지 두드리며 혼자 하는 말이,
“요새 해가 왜 그리 짧은가, 빈 지게 지고 가면 계집년이 방정 떨리.”
사면을 둘러보니 등구 마천가는 길에 어떤 장승이 하나 서 있거늘 강쇠가 반겨,
“벌목 정정 애 아니 쓰고 좋은 나무 거기 있다. 일모도궁 불로소득 좋을시고.”
지게를 찾아지고 장승 선 곳 급히 가니 장승이 화를 내어 눈을 딱 부릅뜨니 강쇠가 호령하며,
“네 이놈, 누구 앞에 색기하여 눈망울을 부릅뜨냐, 삼남 설축 변강쇠를 이름도 못들었느냐? 과거 마천 파시평과 사당놀음 씨름판에 이내 솜씨 사람칠 때 후취덜미 가리딴죽 열두권법 범강장달 허네라도 다들 앞에 떨어지니 수족없는 네깐 놈이 생심이나 바랄쏘'
달려들어 불끈 안고 엇두름 쑥 빼내어 지게 위에 짊어지고 우댓군 소리하며 제집으로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서며 호기를 장히 편다.
“집안사람 거기 있나? 장작나무 하여 왔네.”
뜰 가운데 턱 부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 강쇠 계집 반기느라 손묵 잡고 어깨 주무르며,
“어찌하여 그리 저물었나. 평생 처음 나무가서 오죽이나 애 썼겠는가, 시장한데 밥이나 자시오.”
방안에 불켜놓고 밥상차려 드린 후에 장작나무 구경차 불켜들고 나와보니 어떠한 큰 사람이 뜰 가운데 누었는데 조관(朝官)을 지냈는지 사모품대 갖춰 입고 방울눈에 주먹코 채수염이 점잖았다.
여인이 뒤로 팍 주저앉으며,
“애고, 이게 웬일인가 나무를 하러 간다더니 장승을 빼어 왔네그려, 나무가 아무리 귀해도 장승을 빼어 땐단 말을 언문책 잔주에도 없는 말, 만일 패어 땐다면 목신동통 조왕동증 목숨 보존 못할테니 어서 지고 가서 제 자리에 세우고 왼발 굴러 진언치고 달음질로 돌아오소.”
“가장이 하는 일을 보고만 있을 것이지 계집이 요망하게 그것이 웬 소린고. 나무 깎은 장승 인형을 패어 땐들 무슨 관계있나. 망할 말 다시는 하지 말라.”
강쇠는 밥상을 물린 후에 도끼로 장승을 패서 군불을 놓고 유정부처 홀딱 벗고 사랑가를 불러가며 개폐문(開閉門) 절판례(絶版禮)를 멋지게 하였다.
이 때에 장생목신 무죄하게 강쇠 만나 도끼 아래 조각나고 부엌속에 탄 재가 오죽이나 원통할 것인가.
의지할 곳 없이 중천에 떠서 울렴. 나혼자 다녀서는 이놈 원수 못갚겠다.
대방전에 찾아가서 이 원정 하소연 하오리다.
노들 선창목에 대방장승 찾아가서 문안을 한 연후에 원정을 아뢰옵기를,
“소장은 경상도 함양군의 산을 지키는 장승으로 신지처리한 일없고 평민 침학한 일 없어 불피 풍우(不避風雨)하고 각수본직(各守本職)하옵더니 변강쇠라 하는 놈이 일국의 난봉으로 산중에 주섭하제 집에 가니, 제 계집이 깜짝 놀라 도로 갖다 세우라 하되 아니듣고 도끼로 꽝꽝 패어 때고 화가 안미칠 때가 없을테니 십분 통촉하여 주옵소서. 소장에 성원하고 후환 막게 하옵소서,”
대방 크게 놀라
“이 변이 큰 변이라. 사근네 공원님과 지지대 유사님께 내 정갈 여쭙기를 요새 적조하였으니 문안일향하옵신지 경상도 함양 동관발괄원정 듣사온즉 천만고(千萬古)없던 변이 오늘 생겼으니 수고타 마옵시고 잠깐 왕림 하옵소서, 동의(同意)작처 하옵시다. 전갈하고 모셔오라.”
대방님 좋다 하고 입으로 묻고 통문 넉장 써서 내니 통문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우통유사는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하고 지초가 불에 타면 난포가 탄식하니 유유상종 환락상구 떳떳한 이치로다. 지리산중 변강쇠가 함양 동관 빼어다가 작파(作破)화장 하였으니 이놈 죄 상경홀작 처할 수 없어 각도 동관에 일체로 발통하여 금월 초사홀 삼경에 노들선창으로 일제취회하여 함양 동관 조상하고 변강쇠놈 죽일 꾀를 각출하여 주옵소서.”
연월일 밑에 대방 공원 유사 벌려 쓰고 칙명하고 양문갑읍 긴장목장 각면 각촌 점막사찰 차비전에 전하게 하였는데
통문 한 장은 사근내 공원이 맡아 경기 삼십사관 충청도 오십사관 차차로 전케하고
한 장은 고양 흥제원 도오간이 맡아 황해도 이십삼관 평안도 사십이관 차차로 전케하고
한 장은 양주 다락원 동관이 맡아 강원도 이십육관 함경도 이십사관 차차로 전케 하였다.
귀신의 조화라 오죽 빨리 전했겠는가, 바람같이 구름같이 경각에 다 전하니 조선의 장승 하나도 빠짐없이 기약한 밤에 다 모여 새남터 배게서서 시흥 읍내까지 빽빽하였다.
“통문사를 보았으면 모든 뜻을 알 터이니 변강쇠 지은 죄를 어떻게 다스릴꼬 ?'
단찬 마천 영상봉에 섯던 장승은
“그놈 식구대로 새남터에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귀신의 정기라고 토풍을 따라가니 마천 동관 하는 말이 상쾌도 하지만 계집(옹녀)이 말렸으니 죄를 줄 수 없고 여러 동관님네 다시 생각하옵소서.”
하고 대방이 말했다.
“그놈의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지른 후에 못나오게 하면 그놈도 동관같이 화장이 되오리다.”
“그런 놈에게 불을 지르면 제 죄를 제가 모르고 도깨비 장난인가 명화적의 난리인가 의심할 테니 다시금 생각해 보오.”
하였다.
“그놈을 쉬이 죽여서는 설치가 못될 터이니 고생을 실컷 시킨 후에 죽이되 열아흐레 동안 장승 화장한 죄인 줄을 저도 알고 남도 알아 쾌히 징계될 터이니 우리 식구대로 병하나씩 가지고서 강쇠를 찾아가서 강쇠의 정수리에서 발톱까지 오장육부 내외없이 벽에 도배하듯 겹겹이 발랐으면 그 수가 좋을 듯하오.”
해남동관 하는 말에 대방이 크게 기뻐하였다.
“장히 좋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쇠 몸에 저리 많은 식구들이 달려들면 많은 데는 족이 들고 빠진 데는 틈이 날 것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라 경상 차지하고 오장육부 내장일랑 경기 충청 차지하며 팔만사천 털구멍도 빈틈없이 단단히 잘 발라라.”
이렇게 하여 변강쇠는 조선에 있는 모든 장승들이 가지고 온 수백가지의 병에 드러눕게 되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봉사를 데려와 점을 친 후 봉사는 경채 대신 ‘새큼한 것’을 요구한다. 물론 옹녀의 옥문을 말한다.
함양 지방의 명의를 데리고 오지만 치료가 불가하였다.
결국 변강쇠는 죽고 말았다.
옹녀는 강쇠의 초상을 치루어 주는 이가 있다면 그와 함께 살고자 하였다.
먼저 중이었다.
그러나 변강쇠의 시체를 만지자 말자 그만 죽고 말았다.
초라니 풍각쟁이 마종 떱뜩이들도 옹녀의 새 남편이 되기 위해 변강쇠를 초상치려고 했지만 모두 죽고 말았다.
전설로서의 이 변강쇠전은 무분별한 성문화를 응징하기 위한 이야기로서 오늘날 문란해진 성 문화에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겠다.
목록평안도 월경촌(月景村)에 계집 하나가 살고 있었는데 얼굴은 춘이월 반쯤 핀 복숭아꽃이었다.
보조개(옥빈)는 어리었고 초생에 지는 달빛이 눈썹 사이에 어리었다.
앵두처럼 고운 입술은 당채(唐彩)주홍필로 찍은 듯하고 버드나무같이 가는 허리는 봄바람에 하늘 하늘, 찡그리며 웃는것과 말하며 걷는 것이 서시와 포사라도 따를 재간이 없었다.
그러나 사주에 청상살이가 겹겹이 쌓인 까닭에 상부(喪夫)를 한 것이 징글징글하게 많아 팔자가 센 여자였다.
열다섯에 얻은 서방은 첫날밤의 잠자리에서 급상한(急傷寒)에 죽었고
열여섯살에 얻은 서방은 당창병(매독)에 죽었다.
열일곱과 열여덟에 얻은 남편은 용천병과 벼락으로 각각 죽었다.
열아홉, 스무살에 얻은 서방도 급살로 죽었다.
뿐만 아니었다.
간부, 애부, 새흘유기, 입 한번 맞춘 놈, 젖 한번 만진놈, 눈 흘레한 놈, 손 만져본 놈, 그리고 심지어는 옹녀의 치마귀 상처자락 얼른 대한 놈까지 모두 죽었다.
이렇게 하여 수천명씩 남자들이 옹녀 때문에 죽자 삼십리 안팎에 상투 올린 사내는 고사하고 열다섯 넘은 총각도 다 쓸어버리고 없어 계집이 밭을 갈고 처녀가 집을 지으니 황해도, 평안도 양도민이 공론하기를 이년을 그냥 두었다간 남자 놈은 한명도 없는 여인국이 될 터니이니 쫒아내자고 의논하였다.
그리하여 양 도민이 합세하여 그녀를 서도에서 쫓아내었다.
그때 그녀는 차랑 봇짐 옆에 끼고 머리는 동백기름을 낭자하게 발라 곱게 빗었고 초록 옷을 추스르며 행똥행똥 나오면서 자기 혼자 악을 썼다.
“어허, 인심이 흉악하구나, 내 여기 아니면 살 곳이 없을 줄알고, 삼남(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남자들은 더욱 좋다더라,”
옹녀는 남쪽으로 가다가 청석관(개성 부근의 좁은 계곡)에서 홀아비 변강쇠와 만났다.
변강쇠는 삼남에서 빌어 먹다가 양서지방으로 가는 길이었다.
그들은 서로 만나 말 몇 마디에 뜻이 맞아 바위 위에 올라가서 대사(大事)를 치루었는데 대낮에 년놈이 벌거벗고 익숙한 장난을 하고 있었다.
타고난 양골(陽骨)인 강쇠놈이 옹녀의 두 다리를 번쩍 들고 옥문관을 들여다 보며 노래를 읊었다.
“이상하게도 생겼다. 맹랑히도 생겼다. 늙은 중의 입일는지 털은 돋고 이빨은 없구나. 소나기를 맞았는지 언덕지게 패이었다. 콩밭농사 지었는데 듬북꽃이 비치었구나. 도끼날을 맞았는지 금 바르게 터져 있네, 생수처 온답(溫畓)인지 물이 항상 고이었다.
무슨 말을 할려고 옴질옴질하는 건지 만경창파 조개인지 혀를 빼어 물었으며 곶감을 먹었는지 곶감씨가 장물렸고 만첩산중 으름인지 스스로 잘도 벌어졌네 연계탕을 먹었는지 닭의 벼슬이 비치었고 파명당을 하였는지 더운 김이 절로 난다.
제 무엇이 즐거운지 반쯤 웃고 있구나. 곶감 있고 연계 있고 조개 있어 제사상은 걱정없다'
옹녀가 반소(半笑)하고 갚음을 하느라고 변강쇠의 기물을 어루만지며 한가닥 곡조를 빼어 읊었다.
“이상히도 생겼구나. 맹랑히도 생겼구나. 전배사령(前培伺令) 서렸는지 쌍걸랑을 늦게 차고 군노(軍奴)런가 복떠기를 붉게 쓰고 냇물가의 물방인지 떨구덩 떨구덩 끄덕인다.
송아지 말뚝인지 철고삐를 둘렀구나. 감기를 얻었는지 맑은 코가 웬일인가, 성정(性情)도 혹독하여 화가 나면 눈물난다. 어린아이 병일는지 젖은 어찌 괴였으며 제사에 쓴 숭어인지 꼬장이궁이 그저 있다. 뒷절 큰방 노승인지 민대가리 둥글구나. 소년인사 알밤인지 두쪽 한데 붙어있다. 물방아 절구대며 쇠고삐걸랑 등물 세간살이 걱정없네.”
두 남녀는 서로 뜻이 맞아 부부로 인연을 맺고 각처를 떠돌며
옹녀는 애를 써써 들병장수 막장사를 할 때
변강쇠는 낫부림 넉장기, 갑사꼬리 여사하기, 미골 지패 퇴기질, 호흥호백 쌍육치기, 장군멍군 장기두기, 맞춰먹기 돈치기와 불러먹기 주먹질 고패떼기 윷놀이와 안집 뒷집 고누두기, 의복 전당 술먹기와 남의 싸움 가로막기, 강새암 계집치기, 밤낮으로 싸움질을 일삼았다.
이에 옹녀는 변강쇠를 달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의 성기 가지고는 동반살이 하다가는 돈 모으기는 고사하고 남의 손에 죽을 테니 깊은 산에 들어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산전이나 파서 먹고 땔나무나 베어 때면 노름도 못할 터요, 강짜도 않을테니 산중으로 들어갑세.”
그리하여 그들이 들어갈 산을 의논하였다.
“동금강(東金剛)은 석산이라 나무 한그루 없어 갈 수 없고 북향산(北香山)은 찬곳이라 눈 쌓이어 살 수 없고 서구월(西九月)은 좋다하나 산적떼 소굴이라 살 수 없으니 남지리(南智異)가 토후하여 생리가 좋다하니 그리로 찾아감세.”
여간가산(如干家山)짊어지고 지리산중에 찾아가니 깊은 산골에 빈 기와집이 한 채 서 있었다.
임진왜란 때 어느 부자가 지었는지 오간 팔작 기와집으로 다시 사람 산일이 없는 흉가였다.
누백년 도깨비의 동청이요. 묏귀신의 사당으로 있었다.
거친 뜰에는 삵과 여우의 발자취가 남아 있었다.
“수사도는 간 곳마다 선화당(宣化堂)이라 하더니 내 팔자도 비슷하구나. 적막한 이 산중에 내가 올 줄 누가 알고 나를 위해 이런 기와집을 지어놓고 기다렸는가.”
하고 변강쇠는 말했다.
변강쇠는 이곳으로 이사 온 후로는 낮이면 잠만 자고 밤이면 배만 타니 여인이 애끓게 하소연 하였다.
변강쇠는 하는 수 없이 아내의 청에 따라 지게를 지고 담뱃대를 물고 나무를 하러 산으로 갔다.
“목 긁어 동여지고 석양의 산길 내려올 때 손님보고 절은 하니 품안에 있는 산과(山果) 떼그르르 다 떨어진다. 얼레, 비 맞고 가는 한 손님 술집이 어디 있노. 저 건너 행화촌을 손을 들어 가리킨다. 얼레, 뿔 굽은 소를 타고 단적(短笛)을 불고 가니 유황숙이 보았더면 나를 오죽이나 부러워하리 얼레.”
강쇠가 나무하러 가다가 등구 마천 초군들을 만나 그들의 노래를 모두 들은 다음
제가 보아도 어린 것들과 한가지로 갈퀴나무를 할 수 있나,
도끼 둘러 메고 이봉 저봉 다니면서 그 중 커다란 나무만 한 두 번씩 찍은 후에 나무 내력 말을 하며 제가 저를 꾸짖었다.
“오동나무 벼자하니 요임금의 오현금(五絃琴)이요,
살구나무 벼자하니 공부자(孔夫子)의 강단이라,
소나무 좋다마는 진시황의 오태부(五太夫)요
잣나무 좋다마는 한고조 덮은 그늘이라.
어주축수 애산춘 홍도나무 사랑하옵고
위성조우 읍경진 버드나무 좋을시고
밤나무 신주감이요, 전나무는 돛대 재목이라,
가사목 단단하나 각영문(各營門) 곤장감이요,
참나무 꼿꼿하나 배젓는 대목감이라,
쭝나무 오시목과 산유자 용목, 건팽목 문목은 화목되기 아깝도다.”
이리저리 생각하니 베일 나무 전혀 없다. 산중에 동천맥 우물물 좋은 곳에 점심구럭 풀어 먹은 후에 부쇠를 얼른 쳐서 담배를 입에 물고 솔그늘 잔디밭에 돌베고 누우면서 당음(唐音)한 귀 읊어보네.
“우래송수불(雨來松樹不)에 고침석두면(高枕石頭眠)이 나를 두고 한 말이라 잠자리 장히 좋다.”
강쇠가 잠을 자며 코를 골자 산중이 들썩들썩하였다.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땐 하늘에 별이 총총하였고 이슬이 내리었다 게을리 일어나서 기지개를 불끈켜 뒤꼭지 두드리며 혼자 하는 말이,
“요새 해가 왜 그리 짧은가, 빈 지게 지고 가면 계집년이 방정 떨리.”
사면을 둘러보니 등구 마천가는 길에 어떤 장승이 하나 서 있거늘 강쇠가 반겨,
“벌목 정정 애 아니 쓰고 좋은 나무 거기 있다. 일모도궁 불로소득 좋을시고.”
지게를 찾아지고 장승 선 곳 급히 가니 장승이 화를 내어 눈을 딱 부릅뜨니 강쇠가 호령하며,
“네 이놈, 누구 앞에 색기하여 눈망울을 부릅뜨냐, 삼남 설축 변강쇠를 이름도 못들었느냐? 과거 마천 파시평과 사당놀음 씨름판에 이내 솜씨 사람칠 때 후취덜미 가리딴죽 열두권법 범강장달 허네라도 다들 앞에 떨어지니 수족없는 네깐 놈이 생심이나 바랄쏘'
달려들어 불끈 안고 엇두름 쑥 빼내어 지게 위에 짊어지고 우댓군 소리하며 제집으로 돌아와서 문 안에 들어서며 호기를 장히 편다.
“집안사람 거기 있나? 장작나무 하여 왔네.”
뜰 가운데 턱 부리고 방문 열고 들어가니 강쇠 계집 반기느라 손묵 잡고 어깨 주무르며,
“어찌하여 그리 저물었나. 평생 처음 나무가서 오죽이나 애 썼겠는가, 시장한데 밥이나 자시오.”
방안에 불켜놓고 밥상차려 드린 후에 장작나무 구경차 불켜들고 나와보니 어떠한 큰 사람이 뜰 가운데 누었는데 조관(朝官)을 지냈는지 사모품대 갖춰 입고 방울눈에 주먹코 채수염이 점잖았다.
여인이 뒤로 팍 주저앉으며,
“애고, 이게 웬일인가 나무를 하러 간다더니 장승을 빼어 왔네그려, 나무가 아무리 귀해도 장승을 빼어 땐단 말을 언문책 잔주에도 없는 말, 만일 패어 땐다면 목신동통 조왕동증 목숨 보존 못할테니 어서 지고 가서 제 자리에 세우고 왼발 굴러 진언치고 달음질로 돌아오소.”
“가장이 하는 일을 보고만 있을 것이지 계집이 요망하게 그것이 웬 소린고. 나무 깎은 장승 인형을 패어 땐들 무슨 관계있나. 망할 말 다시는 하지 말라.”
강쇠는 밥상을 물린 후에 도끼로 장승을 패서 군불을 놓고 유정부처 홀딱 벗고 사랑가를 불러가며 개폐문(開閉門) 절판례(絶版禮)를 멋지게 하였다.
이 때에 장생목신 무죄하게 강쇠 만나 도끼 아래 조각나고 부엌속에 탄 재가 오죽이나 원통할 것인가.
의지할 곳 없이 중천에 떠서 울렴. 나혼자 다녀서는 이놈 원수 못갚겠다.
대방전에 찾아가서 이 원정 하소연 하오리다.
노들 선창목에 대방장승 찾아가서 문안을 한 연후에 원정을 아뢰옵기를,
“소장은 경상도 함양군의 산을 지키는 장승으로 신지처리한 일없고 평민 침학한 일 없어 불피 풍우(不避風雨)하고 각수본직(各守本職)하옵더니 변강쇠라 하는 놈이 일국의 난봉으로 산중에 주섭하제 집에 가니, 제 계집이 깜짝 놀라 도로 갖다 세우라 하되 아니듣고 도끼로 꽝꽝 패어 때고 화가 안미칠 때가 없을테니 십분 통촉하여 주옵소서. 소장에 성원하고 후환 막게 하옵소서,”
대방 크게 놀라
“이 변이 큰 변이라. 사근네 공원님과 지지대 유사님께 내 정갈 여쭙기를 요새 적조하였으니 문안일향하옵신지 경상도 함양 동관발괄원정 듣사온즉 천만고(千萬古)없던 변이 오늘 생겼으니 수고타 마옵시고 잠깐 왕림 하옵소서, 동의(同意)작처 하옵시다. 전갈하고 모셔오라.”
대방님 좋다 하고 입으로 묻고 통문 넉장 써서 내니 통문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우통유사는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하고 지초가 불에 타면 난포가 탄식하니 유유상종 환락상구 떳떳한 이치로다. 지리산중 변강쇠가 함양 동관 빼어다가 작파(作破)화장 하였으니 이놈 죄 상경홀작 처할 수 없어 각도 동관에 일체로 발통하여 금월 초사홀 삼경에 노들선창으로 일제취회하여 함양 동관 조상하고 변강쇠놈 죽일 꾀를 각출하여 주옵소서.”
연월일 밑에 대방 공원 유사 벌려 쓰고 칙명하고 양문갑읍 긴장목장 각면 각촌 점막사찰 차비전에 전하게 하였는데
통문 한 장은 사근내 공원이 맡아 경기 삼십사관 충청도 오십사관 차차로 전케하고
한 장은 고양 흥제원 도오간이 맡아 황해도 이십삼관 평안도 사십이관 차차로 전케하고
한 장은 양주 다락원 동관이 맡아 강원도 이십육관 함경도 이십사관 차차로 전케 하였다.
귀신의 조화라 오죽 빨리 전했겠는가, 바람같이 구름같이 경각에 다 전하니 조선의 장승 하나도 빠짐없이 기약한 밤에 다 모여 새남터 배게서서 시흥 읍내까지 빽빽하였다.
“통문사를 보았으면 모든 뜻을 알 터이니 변강쇠 지은 죄를 어떻게 다스릴꼬 ?'
단찬 마천 영상봉에 섯던 장승은
“그놈 식구대로 새남터에 잡아다가 교수형에 처합시다.”
하고 말하였다.
“귀신의 정기라고 토풍을 따라가니 마천 동관 하는 말이 상쾌도 하지만 계집(옹녀)이 말렸으니 죄를 줄 수 없고 여러 동관님네 다시 생각하옵소서.”
하고 대방이 말했다.
“그놈의 집을 에워싸고 불을 지른 후에 못나오게 하면 그놈도 동관같이 화장이 되오리다.”
“그런 놈에게 불을 지르면 제 죄를 제가 모르고 도깨비 장난인가 명화적의 난리인가 의심할 테니 다시금 생각해 보오.”
하였다.
“그놈을 쉬이 죽여서는 설치가 못될 터이니 고생을 실컷 시킨 후에 죽이되 열아흐레 동안 장승 화장한 죄인 줄을 저도 알고 남도 알아 쾌히 징계될 터이니 우리 식구대로 병하나씩 가지고서 강쇠를 찾아가서 강쇠의 정수리에서 발톱까지 오장육부 내외없이 벽에 도배하듯 겹겹이 발랐으면 그 수가 좋을 듯하오.”
해남동관 하는 말에 대방이 크게 기뻐하였다.
“장히 좋소, 그대로 시행하되 조그마한 강쇠 몸에 저리 많은 식구들이 달려들면 많은 데는 족이 들고 빠진 데는 틈이 날 것이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전라 경상 차지하고 오장육부 내장일랑 경기 충청 차지하며 팔만사천 털구멍도 빈틈없이 단단히 잘 발라라.”
이렇게 하여 변강쇠는 조선에 있는 모든 장승들이 가지고 온 수백가지의 병에 드러눕게 되었다.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봉사를 데려와 점을 친 후 봉사는 경채 대신 ‘새큼한 것’을 요구한다. 물론 옹녀의 옥문을 말한다.
함양 지방의 명의를 데리고 오지만 치료가 불가하였다.
결국 변강쇠는 죽고 말았다.
옹녀는 강쇠의 초상을 치루어 주는 이가 있다면 그와 함께 살고자 하였다.
먼저 중이었다.
그러나 변강쇠의 시체를 만지자 말자 그만 죽고 말았다.
초라니 풍각쟁이 마종 떱뜩이들도 옹녀의 새 남편이 되기 위해 변강쇠를 초상치려고 했지만 모두 죽고 말았다.
전설로서의 이 변강쇠전은 무분별한 성문화를 응징하기 위한 이야기로서 오늘날 문란해진 성 문화에 하나의 경고가 될 수 있겠다.
으로
- 담당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 055-960-4510)
- 최종수정일
- 2023.09.18 11:26:31